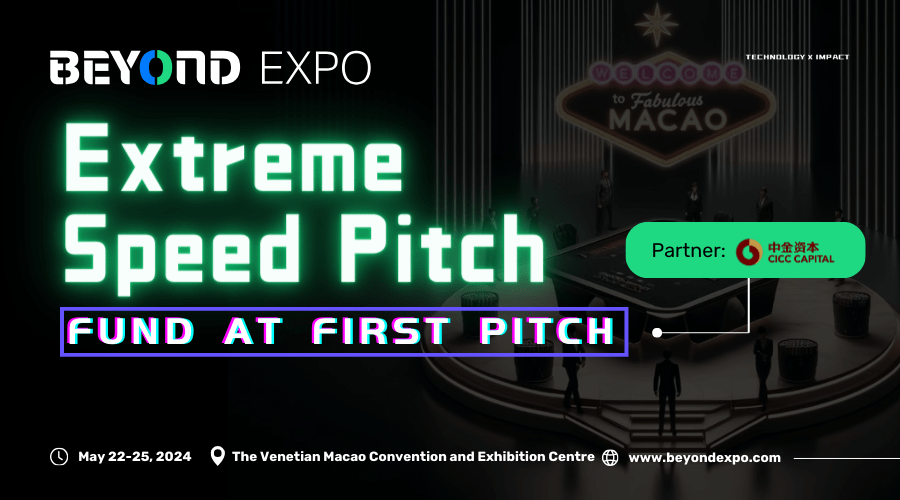첫눈에 반한 한국문화, 알면 알수록 신기방기
한국에서 일을 구하려는 외국인에게 입을 맞춰 조언한 부분이 있었다. 바로 ‘네트워크’다. 그리고 그들은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한국이라서 특히 강조된다는 데에 동의했다. 안톤씨는 “나도 이번 직장을 찾는 데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작용했다”며 “인터뷰를 보기 전부터 주변 지인을 통해 대표님이 나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데 네트워크는 필수적”이라며 “본격적으로 직장을 찾기 전에 한국에 와서 직접 경험해보고 인맥을 쌓아 놓는 게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벨기에에서 온 플로리안 다완스
한국의 유별난 음주 가무 사랑도 그들에겐 색다른 풍경이다. 벨기에에서 온 플로리안 다완스(Florian Dawans)씨는 “동료 직원 중 엔지니어들이 많아서인지 벨기에보다 훨씬 술을 많이 마신다”며 “지금은 젊어서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 문제가 될 것 같았다”고 말했다. ‘동양의 남미’라는 한국의 별명이 자랑스럽지만은 않은 순간이다.
수직적인 직장 내 인간관계도 이들에겐 이질적이다. 사실 스타트업계는 대기업이나 한국의 오랜 기업 전통에 비하면 아주 수평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균형이 딱 맞는 시소와 같은 수평적인 구조에 익숙한 이들은 한국의 스타트업 조차 수직적이라 평가한다. 네이든씨는 “수직적 구조가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30~40년 전 제조업 중심의 한국 사회에나 맞는 이야기”라며 “스타트업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평적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근하게 돌려서 말하는 한국 특유의 의사소통 법에도 그들은 적응이 필요하다. 안톤씨는 “큰 문제나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지만, 직설적으로 말하던 덴마크의 방법과 한국의 대화법에는 차이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은 닫혀있다. 사실 한국인으로서 이 말은 동감할 수 없었다. 나도 외국에서 타지인으로서 그들과 완전히 섞일 수 없는 것을 느껴보지 못한 것이 아니다. 언어의 문제와 조국처럼 사회에 섞일 수 없는 것은 여느 타국에서 느낄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영국에서 온 네이든씨는 “만약 한국 사람이 영국에서 완벽한 언어를 구사하면 우리는 너를 영국사람이라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내가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나 한국사람이야’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웃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에 아직 닫혀있다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단일민족이라는 한국인의 자부심과 아직 오래되지 않은 개방의 역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스믈스믈 기어 나오고 있었나 보다.
Working Hard vs Working Smart
안톤씨는 “나는 업무가 끝나면 곧장 퇴근하지만 동료들은 거의 회사에서 사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나도 업무시간 동안 열심히 내 일을 하지만 혼자 먼저 퇴근을 할 때는 ‘내가 불성실한 건가’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럴 수가 외국인도 동료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출퇴근이 늦는 문화, 퇴근 눈치를 보는 문화에 대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잊지 않는다.
플로리안씨는 “일이 끝났는데도 세 시간이고 네 시간이고 카카오톡을 하고 있는 것을 봤다”며 “한국이 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안톤씨는 ‘파키슨의 법칙(Parkison’s Law)’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파키슨의 법칙이란 업무량과 상관없이 직원수의 비율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법칙이다. 한국의 업무환경은 스웨덴에서 온 안톤씨에게 업무의 비효율성을 말하는 파키슨의 법칙을 떠올리게 한 것이다.
당신은 ‘워킹 스마트(Working Smart)’를 지향하는가 ‘워킹 하드(Working Hard)’를 지향하는가? 이 질문을 맞닥뜨리면 백이면 백, 워킹 스마트라고 답을 할 것이다. 한국은 과연 스마트하게 일하고 있는가? 내가 만난 외국인들은 이 점이 한국과 외국의 업무 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라고 말한다.
네이든씨는 “한국사람들은 항상 내가 얼마나 늦게까지 일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며 스마트하게 일하기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데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주장한다. 외국에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할 것인지, 즉 짧은 시간과 노력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데에 훨씬 신경 쓴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요즘 드라마 ‘미생’이 한창 유행이다. 쓰디쓴, 녹록지 않은 직장인의 애환에 국민이 동감하고 있는 것이다. 미생이 외국어로 번역돼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본다면 그들도 크게 고개를 끄덕일 것 같다.
외국인도 피해갈 수 없는 청년실업문제
대한민국은 꽤 오랫동안 실업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오고 있다. 사실, 이 취업난은 한국 밖에서도 그리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심각하다. “이공계를 전공해서 소프트웨어 기술을 배웠어야 해요.” 놀랍게도 외국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유럽의 자국에서 비즈니스를 전공한 D씨는 졸업 후 자국 정부의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왔다. 처음 한국에 들어올 때는 자국 정부의 장려금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끝나고부터다. 그 이후 직장을 스스로 힘으로 찾아야 하지만 녹록지 않다. 그는 “유럽이 중동, 남미, 아시아에 비해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 출신이 일자리를 구하기 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나는 불어를 잘하지만 한국어와 불어를 동시에 하면 모를까, 불어와 영어를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는 큰 쓸모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실 그가 취업하는데 가장 큰 장벽으로 선택한 것은 언어다. “매니저급의 경력이 있으면 모를까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이 일자리를 찾는 것은 정말 힘든 것 같다”고 그가 고백했다.
한국어를 못하다 보니 구인 정보를 찾는 것도 녹록지 않다.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 사이트, 링크드인(Linked-in)도 아직 한국에선 자리를 잡지 못해 외국인 구직자의 해결책이 되어주지는 못한다. “링크드인이나 대학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하곤 하지만 좋은 정보를 찾기란 쉽지 않다”고 그가 덧붙였다.
이에 한국어를 배울 생각은 안 해봤느냐는 질문에 D씨는 “한국어를 배운다고 2년을 허비할 바에 다른 나라를 찾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안정된 직장이 구해져 한국에서의 생활이 보장된 후라면 당연히 한국어를 배우겠지만, 직장을 구하기 위해 2년이나 한국어를 배우며 시간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년 동안 공부해 한국어를 마스터한다고 해도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네이든씨는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중소기업에서 기회를 본다. 경제적으로나 여유가 생겼고 해외로의 진출을 모색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니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는 스타트업에 기회가 많다. 대기업은 왠지는 모르지만,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은 진행한 적이 없다.
한국인들은 잘 모르는 '20%의 법칙'
또 한국인들은 잘 모르는 ‘20%의 법칙’이 있다. 바로 ‘고용자 중 외국인의 비율이 20%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인 고용의 안정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20%라는 이 숫자가 이 문제다. 스타트업의 경우 많은 수의 직원을 두는 것이 쉽지 않다. 외국인 1명을 두기 위해서 내국인 4명의 채용이 필수적인 20%라는 이 숫자는 스타트업에게는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법적 제약에 한 외국인은 소속을 속여서 신고하기도 했다. “ㄱ회사에서 일 한지 2년이 넘었지만 얼마 전에서야 이 회사 직원으로 소속이 변경됐다”고 A씨는 말했다. 회사의 취지를 같이해 한국의 스타트업에서 일하게 됐지만 그 회사의 직원이 2명밖에 안됐던 것이다. 할 수 없이 A씨는 ㄱ회사 대표의 친한 친구가 대표로 있는 ㄴ회사의 ‘서류상 직원’이 됐다. 일은 ㄱ회사에서 했지만, 법적 절차를 위해 ㄴ회사 소속의 직원으로 거짓 서류를 꾸몄던 것이다. A씨는 “월급을 ㄴ회사에서 받기 위해 회사에서 광고 명목으로 ㄱ회사로 지출 내역을 만들어야 했지만, 그 외에 큰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위해 다양한 외국인을 만나면서 든 생각은 ‘다 똑같구나’였다. 외국인이라서 별다를 게 없이 내가 외국에서 느끼는 감정과 직면하게 되는 문제 그리고 한국 사외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과 고충들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었다.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