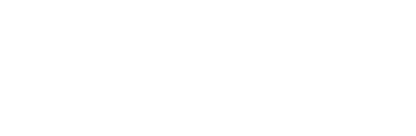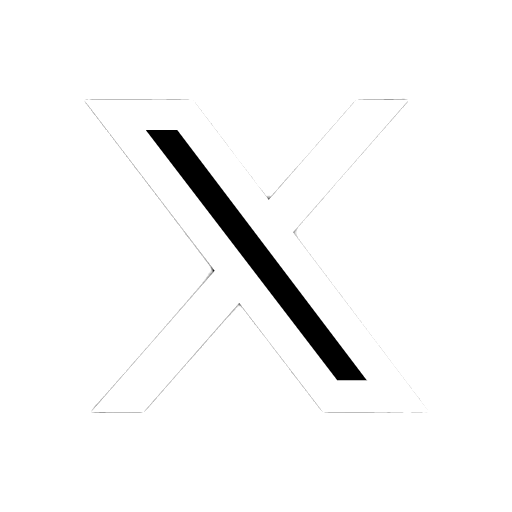기본적으로 창업이라는 것이 ‘Impact를 남기고 싶다’는 동기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필자를 비롯한 거의 모든 창업가들이‘나이스(Nice) 한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모바일에서도‘창업가(Founder)’가 아니라 ‘기업가(Entrepreneur)’가 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지난 2 월 22 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KRX”)가 승인요청한 KOSDAQ 및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KRX가 요청한 이번 개정안은 크게, 1) 창업 초기 벤처들이 거래될 수 있는 코넥스(KONEX) 시장을 신설하고, 2) 유가증권 시장은 대형기업 및 우량기업 위주로 재편하며, 3) KOSDAQ은 기술형/성장형 혁신기업 중심의 시장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는 세 가지 골자를 담고 있다.
당신이 혁신적이지 못한 이유는 다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름으로 인한 거북함을 기꺼이 감내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달라지기를 무릅쓰지 않는 한 당신은, 우리는 결코 혁신적이 될 수 없다.
2013 년을 맞아 우리는 B2B를 주목하여야 한다. 실제적인 경제적 가치를 발생시키는 성공적인 스타트업이 탄생되어야 한다. 이 때에만이 우리나라에 완전한 벤처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정부, 기존기업, 그리고 기업가(Entrepreneur)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2013 년을 우리 B2B 스타트업의 원년으로 만들자.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직 시도하지 않은 기술 기반의 사업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모하고, 어떤 면에서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중략)… 만약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절대 세상에 선보일 수 없을 것 같은 프로젝트를 찾고 있습니다.”
역설(Paradox)은,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뜻하는 “혁신”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 삶에서 가장 익숙한 단어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 산업과 규모를 막론하고 각 기업들은 저마다 자신의 Offering이 혁신적인 것임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혁신적인 제품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다채로운 것으로 만들어 주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소비자로서의 우리가 그들 모두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음 역시 사실이다.
지난 주 글로벌 증시 IT 섹터에서 가장 큰 이야기 거리 중 하나는 단연 지난 16 일(현지시간 15 일)에 있었던 APPLE 주가의 급락이었을 것이다. 비정유사로는 최초로 세계최대 시가총액을 기록하였으며, 지난 2012 년 9 월 21 일에는 52주 최고가인 $705.07를 기록하기도 하기도 했던 APPLE이 전일 대비 3.15% 급락하며 $483.38까지 추락한 것이다. “혁신”이라는 단어를 우리와 가장 친숙한 것으로 만들어 주었던 APPLE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빨리 몰락하고 있는 것일까?
그 조직이 크던 작던, 대기업이던 이제 막 창업한 스타트업이던, 리더로서 CEO의 임무는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그 실현에 필요한 올바른 문화를 조직 내에, 가능한 이른 시간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다.
좀 고리타분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이디어를 들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들 중 하나가 법률적 적합여부인 것은 필자의 업과 관련된 어쩔 수 없는 직업병이다. 기가 막힌 안(案)이라고 만들어 낸 것에서 법률적 이슈가 발생하는 것이 생각보다 빈번하기 때문이다. 고객사와의 이야기는 공개할 수 없으니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만 이야기해 보자.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이렇게 시장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이 훨씬 훨씬 고통스럽고 멀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기본이고, CEO 리더로서 가장 먼저 시장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잘 돌파할 수 있다면 그것이 CEO가 본격적인 기업가로, 스타트업이 제대로 된 기업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줄 것이다.
beSUCCESS 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유의미한 경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창업을 시도하고 있는 우리 독자들이 느끼고 있는 창업과 관련한 도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자금관련 34% / 인력확보 24% / BM설정 16% …..
지난 주에 발행한 스타트업 레포트 1에 이어, 이번 주에는 우리 창업가들이 글로벌 시장의 진출에 있어 느끼고 있는 도전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국내 스타트업들에게 글로벌 시장 도전은 필수적인 것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지난 주에 공유된 결과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beSUCCESS 독자들 중 대다수가 시도하고 있는 인터넷 벤처 분야, 그 중에서도 App Business를 예로 살펴보자.
우리는 우리 독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하였고, 곧 “우리 독자들께 보다 실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래서 필자는 beSUCCESS의 역할, 즉 스타트업을 위한 Unique하고 질 좋은 정보의 전달자라는 역할에 더욱 집중, 앞으로 3 주 간 이번 설문을 통해 얻어진 우리의 이해를 독자들과 공유해 볼 것이다.
2012년 Q3까지 美 VC들의 활동은 투자건수 및 금액 모두에서 전년대비 감소하였는데, 특히 Seed Stage에서 Q3까지 196 건으로 전년도의 438 건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VC들이 스타트업들의 투자유치필요성이 감소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Need-base의 투자배분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국내 엔젤투자의 평균규모는 기업당 약 3,000만 원 가량이며, 더욱이 실제 집행된 금액은 약 34억 원에 불과하다. 연간 약 60,000 개의 기업이 평균 USD 338,000 (약 3억 5천만 원)을 엔젤투자를 통해 조달하는 미국의 경우에 비하면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엔젤투자는 어떻게 그처럼 활성화될 수 있었는가?
미국 엔젤투자의 중심에 있는 소위 “수퍼엔젤(Super Angel)”중 한 명인 론콘웨이(Ron Conway)는 아마도 그에 대한 단적인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광고를 접한 후 실제 매장에서 구매한 소비자 중 99%는 온라인 광고를 보기만 하고 실제로 Click 등의 반응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계의 ‘계’와 같은 한자(界)를 사용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같은 한자가 ‘업계’에도 사용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 밥에 그 나물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 혁신은 고사하고 새로운 것이라도 좀 나올 수 있는 시발점 아니겠는가?
Lean Startup이라는 개념은 기존 경영학에서 ‘탐험적 마케팅’이라는 개념으로 이미 존재하던 것이다. 뭐라고 불리든 그것이 목표하는 바는 같다 “홈런을 치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많은 타석에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테크크런지 디스럽트의 개막을 알린 키노트는 Twitter와 Square의 창업자 Jack Dorsey였다. 자신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한 키노트는 ‘Founder’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매우 철학적이고 심오한 이야기로 이어져 청중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년 발간되는 본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총 144 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19 위를 기록, 지난 해의 24 위에 비해 5 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위스는 4 년 연속으로 1 위로 선정되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