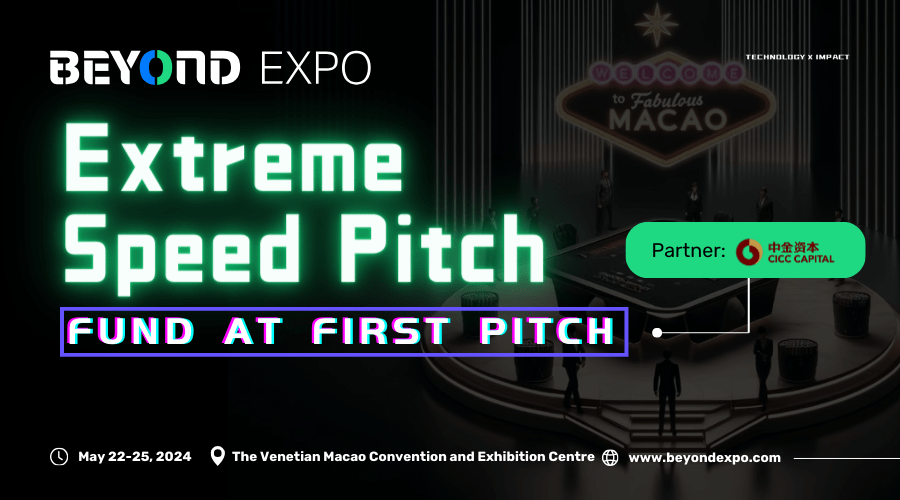"DNA도 언어일까?"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개발자는 자바스크립트나 C++ 같은 개발언어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작가는 문장으로 캐릭터를 창조합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있다면 그도 우리를 만들기 위한 언어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럼 우리 안의 DNA 다발은 혹시 개인의 성향이나 재능 같은 것들을 기록한 문장일까. 간혹 어떤 창의적인 문장을 쓰면 세기의 천재나 털 색깔이 다른 돌연변이가 나오는 걸까.. 우리는 모두 다른 문장일까? 질문들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블레이드 러너 2049>(Blade Runner 2049, 2017)의 주인공 K케이 (라이언 고슬링)도 이런 궁금증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K는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진 안드로이드 조이(아나 드 아르마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개의 DNA 문자열로 구성된 인간보다 0과 1로 이뤄진 네가 더 우아해.
가짜 같은 진짜와 진짜 같은 가짜, 기계 같은 인간과 인간 같은 기계
<블레이드 러너 2049>는 전작 <블레이드 러너>를 잇는, 무려 35년 만의 후속작입니다. 저 대사가 보여주듯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전작의 철학적 고뇌를 이어받았습니다. 황폐하고 고독한 디스토피아적 정서 역시 우아하게 계승했습니다. '기술이 발달해 안드로이드가 인간처럼 사유하고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안드로이드는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전작은 이 질문을 놓고 인간의 우주 식민지 개척에 쓰이던 레플리컨트(인조인간)가 인간에게 반기를 드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35년을 지나 <블레이드 러너 2049>는 다시 좀 더 집요하게 묻습니다. "이게 인간이 아니면 대체 뭐냐?"고 관객에게 말을 겁니다. 영화 속 안드로이드들은 인간보다 훨씬 인간적입니다. 제조사가 내건 슬로건 "More Human Than Human" 그대로입니다. 이들은 인간처럼 느끼고 사유함을 넘어, 우리가 그렇듯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혼란스러워하고 존재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고, 좌절하고, 대의를 위해 숭고히 희생하기도 합니다. "옳다고 생각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게 가장 인간다운 일이 아닐까." 인간들로부터 도망친 레플리컨트 반군의 리더 프레이사는 K를 설득하며 이렇게 말하네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가치'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인공심장으로 숨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술이 더 발전하면 곧 여느 SF영화에서처럼 인간의 신체비율에 인체보다 의체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육체의 조건으로는 인간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답은 정신적인 부분에서 찾게 됩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인간이다." 누군가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다 사람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다움이 곧 인간이다.' 이런 명제가 나오죠. <블레이드 러너 2049>는 이 명제를 저변에 두고 관객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삶을 살고, 심지어 레플리컨트들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을 수 있다면, 이것은 인간인가 아닌가? 이렇게 말이죠. 어려운 질문이고, 그래서 재밌는 질문입니다.

조바심내지 않고 내 걸음으로 내 갈 길 가기
이 질문을 놓고 스크린에 펼쳐낸 결과물은, 압도적입니다. <블레이드 러너 2049>는 일반 관객도 영화가 종합예술이란 사실을 상기하게 될 만큼 모든 부분에서 감탄스럽습니다. 제작, 연출, 각본, 촬영, 연기, 음악, 미술, 조명, 의상 등 각 분야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모여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역대 R등급(미국의 19세 등급) 영화를 통틀어 4번째로 큰 제작비인 1,500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쉽게 볼 수 없는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쌤 리라는 기타리스트가 언젠가 "클래식의 매력은 한음 한음 각기 음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거장들이 다 모여서 영화를 만들자, 그야말로 클래식 같은 영화가 나왔습니다. 분야별 거장들이 오케스트라를 이뤄 드니 빌뇌브와 리들리 스콧의 지휘 아래 신중하고, 깊고, 웅장한 심포니를 연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감독 드니 뵐뇌브Denis Villeneuve 특유의 차분한 호흡이었습니다. <컨택트>(Arrival, 2016) 등의 전작들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조바심내지 않고 차분히 연출했습니다. 아니, 아예 작정하고 더 느리게 갔습니다. 어쩌면 미술관을 거닐 때처럼 느린 걸음으로 거장들의 장면 하나하나를 천천히 음미하길 바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리듬이 놀랍습니다. 전설 같은 전작의 존재, 현존하는 최고의 제작진을 갖췄다는 사실, 천문학적인 숫자의 제작비. 감독에겐 이 모든 것이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차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응당 흔들리고도 남을 상황에서도 '빨리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 없이 시종일관 자기 호흡을 지킵니다.
자기 밖의 요소들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자기 호흡 유지하기. 어마어마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SF 블록버스터 영화라고 팡팡 터져야만 잘되는 게 아니듯, 스타트업의 성장도 반드시 화려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합니다. 언론에 대서특필 되고 여기저기 불려 다녀야만 잘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변의 기대치와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이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언뜻 느려 보이지만 결코 느리지 않죠.
내 호흡은 어느 정도의 템포인지, 지금 그런 호흡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들 따라가려다 헐떡이고 있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봅니다.
영화 이미지 ⓒ Warner Br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