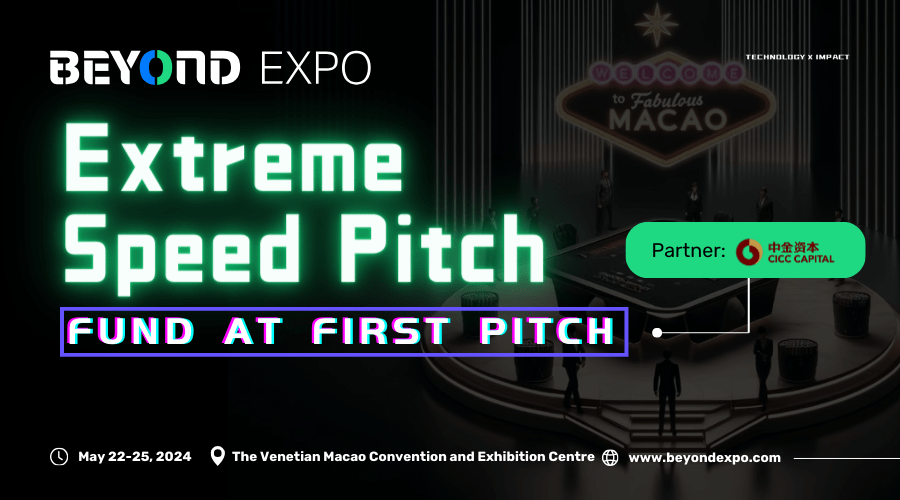2012년 가장 재미있던 한국 영화 중 하나는 <범죄와의 전쟁-나쁜놈들 전성시대> 였다. 영화가 특별히 재미있었던 이유는 예전 어린아이의 눈으로 목격했던 한국 사회의 모을 생생하게 다시 재현했기 때문이다. 내가 초중고 학생으로 살았던 80-90년대는 정말로 <나쁜 놈들 전성시대>였다. 조폭들만 나쁜놈이 아니었다. 영화에서 최민식이 그렸던 공무원, 경찰, 회사원들이 일상 속에서 저지르는 자잘한 비리들은 그 시대엔 생활의 일부였다.
과속 단속에 걸리면 1만 원짜리 한 장 쥐여주는 것으로 넘어갔었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맞고 돌아올 때면 엄마들은 하얀 봉투를 책 속에 꼬옥 넣어 건네야 했다. 우리 동네에는 한국에서 그 당시 샐러리맨으로 살았던 분들이 여럿 계시다. 이분들의 샐러리맨 <활약상>들을 들을 때면 흥미진진하다. 대기업 말단 사원을 불러 수백만 원짜리 양복을 맞추어주던 하청업체의 접대와 고스톱판에서 잃어주는 돈으로 은근히 전달하던 뇌물 이야기 등등. <그땐 참 모두들 나쁘게 살았지…> 이렇게 말끝을 흐리시는 추억담을 듣곤 한다.
대학교 버전의 <나쁜놈들 전성시대>역시 크게 다를 바 없다. 용돈으로 나오는 몇십만 원 월급을 고스란히 교수님에게 상납해야 했던 대학원생들 사이에선 다양한 <학교 전설>들이 구전되었다. 해외 연수를 가면 학생들의 여행경비를 압수해 가족의 동반 여행에 여비로 활용하던 사람도 있고, 연구 장비로 책정된 예산으로 본인 집 냉장고 산 교수의 이야기는 전설 중 레전드였다. 신임 교수 자리가 나오면 모집 요강의 내용까지 바꿔가며 자기 사람을 불러주고, 신임은 선배의 은혜가 고마워 교수 계급사회의 아래에서 묵묵히 선배 교수에게 프로젝트, 논문의 한자리를 상납하곤 했다. 계급의 맨 바닥에 깔려있는 대학원생은 자기가 쓴 논문의 앞자리 이름을 지도 교수에게 양보하면서 <내가 졸업만 해봐라 이쪽으로는 오줌도 안 싼다> 다짐을 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
조폭들에겐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했다면, 부패한 학교들에게 가해진 조치는 <규칙>과 <정량 평가>다. 교수를 임용할 때 돈이 오가거나 선후배 끌어주기가 심하다는 지적에 <오케이, 그럼 신임교수 뽑을 때나 교수 평가할 때는 SCI 논문 갯수로만 합시다> 하면 깔끔한 승부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다. 교수들이 연구비를 임의 전용한다면, <오케이, 그럼 연구 제안서에 회식비 등 짜잘한 항목까지 정확하게 적게 하고 나중에 다 영수증을 검사합시다>. 범죄와의 전쟁에서 경찰과 검사가 활약했다면, 학교에는 이렇게 <규칙>과 <정량평가>라는 객관적인 감시자를 붙여놓았다. 국가에서 SCI(Science Citation Index,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라는 규칙을 정하니 학교들은 군말 없이 잘 따른다. 아니 사실은 잘 따르는 게 아니라, 새 규칙에 잘 적응해가는 것이다. 프로젝트 제안서에는 몇 개의 SCI논문을 쓸 것인가 약속해야 한다. 정교수로 승진하기 위해서 몇 편 이상의 SCI 논문을 써내야 한다. 둘 다 논문의 품질은 상관이 없다. 그게 이 바닥의 새로운 룰이니 최민식이 그랬듯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그런데 문제는 SCI 논문이라는 이 기준이 어떤 분야에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전공하고 일하는 컴퓨터 과학 (혹은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SCI 논문으로 연구를 평가하는 것은 정말 <불 쉿>이다. 그냥 <불 쉿>이 아니고 진짜 큰 소의 <불 쉿>이다. SCI는 책으로 발간되는 논문집 말고 컨퍼런스에서 발표되는 논문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컴퓨터분야의 발전 속도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연구 결과들을 대부분 컨퍼런스에서 발표한다. 단언컨대 컴퓨터 연구계의 <일진>들은 SCI로 분류되는 논문집에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 심사하는데 1-2년 소비하고 학회지에 논문이 출판되면 이미 흘러간 옛이야기가 돼버리고 마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보자. SOSP와 OSDI라는 두 개의 학회는 운영체제, 시스템 분야에서는 넘사벽의 학회다. 매년 백 편 이상의 논문이 제출되지만 약 20편 정도만 학회에서 발표할 수 있다. 그렇게 논문을 제출해보기라도 하는 학교들이 보통 MIT, Berkeley, CMU 와 같은 곳들이고, 평범한 미국의 주립대학들은 사실 논문을 내 볼 엄두도 잘 못 낸다. 두 학회에서 논문을 한 편이라도 발표한 사람 만나면, 이 바닥에서는 형님대접 해드려야 한다. 미국의 아무 학교에 지원서를 내도 서류 심사에서는 특별 대우를 받는다. 그런데, 두 학회에 논문을 10편을 쓴 가공의 인물이 있다고 하고,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는지 한국 학교의 교수 임용에 신청서를 냈다고 해보자. 하지만 이 사람은 SCI 점수가 0점이라 서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 어디 아프리카에서 발행되는 학회지라도 SCI에 낸 게 있는 사람보다 낮게 평가받는다. 이거 말고 더 큰 <불 쉿>이 어디 있단 말인가?
나는 미국에서 박사과정 중 2008년에 <슈퍼컴퓨팅> 콘퍼런스라는 곳에 논문을 냈다. OSDI, SOSP까지 수준은 아니지만 내 분야에서는 최고이고 컴퓨터과학계에 가장 유명한 콘퍼런스중 하나다. 그런데 소가 뒷걸음치다가 개구리 밟듯 운이 좋았는지 <최고논문상> 후보에 올랐다. 내공이 모자라 상은 받지 못했지만,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 자랑할만한 성과다. 콘퍼런스의 경쟁률이 5:1 정도 되고, 약 30개 논문 중 4편이 후보에 올랐으니 40:1 정도의 경쟁이었을 것이다. 그 이듬해 한국에 갈 일이 있어 모교에 들렀다. 예전 교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그 논문에 관해 이야기를 꺼냈던 것 같다. 이런 대화가 오갔다.
나: <교수님 저 이번에 이런 논문 썼습니다…>
교수님: <응.. SCI를 써야 해.. 한국에 교수로 오고 싶으면 SCI를 써야지 아니면 서류심사에서 통과를 못해>
나: <미국 학교들에선 SCI에 안내는 거 아시잖아요…>
교수님: <으응..나도 알고 과에서도 알지.. 근데 규칙이야.. SCI를 써야 해..>
SCI도 쓰면서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어떤 분야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컴퓨터과에서는 전혀 아니다. 허접한 SCI 학회지들에 일 년에 몇 개의 논문을 내기 위해선 <일진> 수준의 연구는 현실적으로 포기해야 한다. <일진> 수준의 연구를 하기 위해선 <일진>들이 노는 물에 가서 놀아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SCI에서 놀지 않는다. 사실 미국의 컴퓨터과 교수들은 SCI라는 평가기준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졸업을 2년 정도 앞둔 내게 선택은 <한국에서 교수하고 싶으면 타협하고 SCI 방식으로 연구하거나> <진짜 일진이 되고 싶으면 SCI는 무시하고 수준 있는 학회들에 논문을 내거나> 둘 중 하나였다. 나는 후자를 선택하는 게 옳다 여겼다. 주변에 전자를 선택하는 사람도 여럿 보았다. 똑똑해서 일진될 재목 같았던 분들이 전자를 선택할 때는 좀 안타까웠다.
내가 가장 <불쉿>이라고 느끼는 것은 <응 나도 알고 과에서도 알아. 근데 규칙이야> 이 대목이다. 몇 해 후 모교를 방문해서 다른 교수님과도 대화를 나눴다. 나이 지긋하시고 학교에서도 파워 있으신 교수님 역시 같은 이야기 <자네 발표 잘 하던데…SCI는 좀 썼나?.. 나도 알고 과에서도 아는데…규칙이라서…>. 컴퓨터과의 얼마나 많은 재능있는 사람들이 이 멍청한 규칙에 세계적인 연구자 되기를 포기해야하는지 모른다. 교수도 알고, 학교도 알고, 심지어는 교육계의 관료도 문제를 안다고 생각한다. 부패를 막으려고 만든 규칙이 독이 되어 개인과 시스템을 서서히 죽이는 걸 알지만, <근데 규칙이라서…>를 위선적으로 대뇌어야 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인가?
이것이 단순히 학교 안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은 아니다. SCI 못지않은 초대형 불쉿 <공인인증서>를 보자. 1999년 막 인터넷이 한국에 보급되면서 제정된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국가 <공인인증서>. 본래는 처음 인터넷을 접하는 국민들에게 해커들의 헤꼬지를 막아주려 한 선한 의도의 <규칙>이다. 지금껏 15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인터넷 기술은 완전히 달라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인인증서 불쉿>을 외쳐왔는지 모른다. 공인인증서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수백만 건의 개인정보는 유출되고 있다. 오히려 공인인증서의 본 의미도 모르는 채 무조건 클릭하게끔 사람들을 적응시켜 보안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전락했다. 인터넷 회사들의 결제 과정에 등장해서는 사용자 경험(UX)을 똥칠해 버리지만, 법률이라 스타트업, 인터넷 기업들이 혁신할 기회가 없다. 그 사이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원클릭>이라는 인터넷 상거래의 혁신으로 전 세계를 먹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리 목이 터져라 <공인인증서 불쉿>이라고 외쳐대도 변화가 없다. 늘 되풀이된다. <공인인증서가 아닌 건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근데 규칙이야>.
법은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어쩔 수 없이 발휘돼야 하는 필요악이다. 우리는 사회가 성장하면서 겪은 <나쁜놈들 전성시대>에 질린 나머지 <너도 알고, 나도 아닌 걸 알지만 어쩔 수 없는 규칙>의 노예로 살고 있다. 교수들의 양심을 믿고 SCI 규칙을 풀었다가는 학교들이 또 부정하게 신임 교수들을 뽑을까 봐서. 교수들의 연구 관리를 자유롭게 풀어주면 또 세금으로 자기 집 냉장고 살까 봐. 국민의 인터넷 실력을 믿고 공인인증서 규칙을 풀었다가는 전부 해킹 당할까 봐서. 그래서 아무리 <불쉿><불쉿>대도 규칙을 풀지 않는다. 그 사이 학교와 인터넷은 세계에서 경쟁력을 잃어가지만, <나쁜놈들>의 기억이 얼마나 강력한지 좀처럼 자유를 허락지 않는다. 그러나 어쩌면 사회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개개인은 훨씬 더 많이 발전했는지 모른다. 급격한 성장의 마약에 취해 한때 양심을 잊은 적이 있지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나은 직업적 양심, 소명,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을지 모른다. 양심에 의한 자율이 다스리는 사회가 법치국가보다 훨씬 더 나은 곳이다.